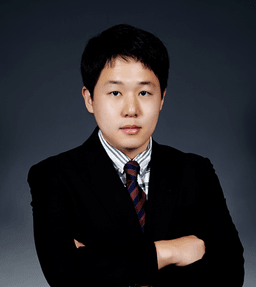임대차
호텔 점포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 다툼 사건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의 한 점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임대인 D, E의 자녀들인 피고들과 D, E는 호텔을 주식회사 G에 매도하였습니다. 호텔 매각 과정에서 D, E, 피고들, 주식회사 G 사이에 이루어진 조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D, E가 지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는 점포를 주식회사 G에 인도한 후 D, E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34,089,64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D, E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들이 조정조항에 따라 D, E와 연대하여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진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청산종결간주법인 주식회사 A: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했던 법인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입장
- 피고 B, C: 이 사건 호텔의 전 소유주 D, E의 자녀들로, D, E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에 연대 책임이 있다고 주장받은 당사자들
- D, E: 이 사건 호텔의 원래 소유주이자 원고의 임대인으로, 피고 B, C의 부모
- 주식회사 G (소외 회사): 이 사건 호텔을 D, E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새로운 소유주
분쟁 상황
한 회사가 호텔 내 상가를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던 중, 해당 호텔의 소유권이 임대인 가족으로부터 다른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새 소유주 간의 소송이 있었고, 항소심 조정에서 임차인(카페 회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조정은 '기존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고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며, 그들의 자녀들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카페 회사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점포를 새 소유주에게 인도하고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카페 회사는 항소심 조정 내용에 따라 기존 임대인의 자녀들이 자신에게 보증금을 연대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녀들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들이 주식회사 G와의 조정조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거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주식회사 G와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병존적 채무인수 약정이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G로 이전된 후에도 D, E에게 차임을 계속 지급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계를 D, E와 유지했으므로 주식회사 G가 원고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G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식회사 G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주식회사 G의 채무를 인수할 수 없으며, 조정조항은 원고와 D, E의 임대차관계를 기간 만료일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합의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자가 D, E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셋째, 이 조정조항은 조정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정하기 위한 것이지 원고에게 직접적인 권리를 부여하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G는 건물의 인도가 지체되지 않도록 D, E와 피고들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G는 원고와 대가관계가 없고 원고에게 직접 청구권을 취득하게 할 만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병존적 채무인수'의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민법 제539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해 제3자가 직접 계약 당사자 중 일방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의 행위 성질,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득실,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과 주식회사 G 사이의 조정 조항이 원고에게 직접적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부여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의 채무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제3자가 그 채무를 함께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이는 기존 채무자가 채무에서 벗어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별됩니다. 병존적 채무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인수하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G가 원고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들이 존재하지 않는 주식회사 G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법리도 관련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특별법에 따라 임차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주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유권 이전 후에도 기존 임대인 D, E에게 계속 차임을 지급하는 등 기존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주식회사 G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새로운 소유주 간의 합의나 행위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 승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임차 중인 건물의 소유주가 변경될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 변동 후에도 임대인 지위 승계가 아닌 기존 임대차 계약 유지를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대료 납부 대상 등 계약 관계의 실질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조정 내용이 제3자에게 직접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 당사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정하는 것인지 그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채무를 인수하는 약정이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의사가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3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이라면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정주헌 변호사
법무법인 골드웨이 본사무소 ·
부산 연제구
부산 연제구
전체 사건 267
임대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