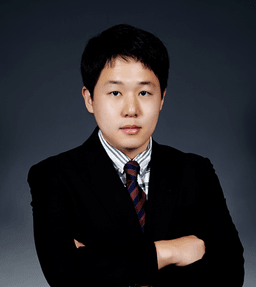임대차
내가 한 인테리어도 아닌데 왜 내가 철거하나요.
‘원상회복의무’가 있지만, 크고 작은 분쟁은 계속되
물건을 빌렸다면, 그 물건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도 빌린 물건을 원상대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이를 법률상 '대차 관계에서의 원상회복의무’라고 합니다. 빌렸다면 빌린 원상태 그대로 반환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하게 물건을 반환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하면서 물건이 손상되거나 자연스럽게 마모되거나 노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빌린 물건을 수선하여 기능이나 품질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대가를 지급하고 물건을 빌리는 임대차계약에서 ‘원상회복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두고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집을 비울 때 못 하나 잘못 박은 문제로 집주인과 얼굴을 붉히는 일이 그렇다. 다만, 못자국 몇 개 정도는 돈 몇 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시설을 이어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개조부분만 원상회복하면 족해
하지만 목돈을 들여 영업 시설을 설치한 경우라면 문제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기존에 설치한 시설을 다음 임대차에서 그대로 활용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때, 임차인들끼리 시설권리금을 주고받으며 서로 정산합니다. 그러다가 여러 임차인이 특정 시설을 활용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될 때, 비로소 원상회복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오래전 대법원은 임차인이 유흥주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이어받아 내부 시설을 개조한 사안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자신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임차받은 상태로 반환하면 되고, 그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즉, 임차인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자신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을 때의 상태를 기준으로 새롭게 설치한 시설만 복구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전에 누가 어떤 시설을 설치했든 상관없이 임대받은 그대로만 반환하면 될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A는 2014년 6월, 커피전문점을 인수하고 점포를 임차했습니다. 커피전문점은 2010년부터 운영되었고, A는 당시 전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시설 등을 양수하며 권리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 A 소유의 인테리어 시설과 장비를 원상회복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A는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임대인 B가 제시한 조건과 맞지 않아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A는 인테리어 가구와 제빙기 등 기계만 회수하고, 인테리어 시설과 흡연 부스 등은 철거하지 않은 채 점포를 B에게 인도했습니다. B는 공사업체를 통해 1,700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 시설 등을 철거한 후, 그 비용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A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시설과 흡연 부스를 누구의 비용으로 철거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항의 끝에 A는 B를 상대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은 전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 그대로 인수했으므로 그 이전 상태의 설비를 철거할 의무가 없고, 인테리어 시설 등은 점포에 부합되어 더 이상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판결을 포함한 3심 모두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기존권리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았다면 모두 원상회복해야
대법원은 A와 같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이어받은 행위라도 기존 관계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제3자의 새로운 임대차 관계를 발생시키는 경우와 기존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구별했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52933 판결). 만약 전자라면 자신이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겠지만, 후자라면 모든 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B가 철거한 시설 대부분은 A가 점포를 임차하기 전, 커피전문점 영업을 위해 설치된 것이었고, B는 전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법원은 A는 임차인 지위를 양도받은 것이라고 판단했고,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도 철거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A의 주장처럼 시설이 점포에 부합돼 일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B가 철거한 시설들은 특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운영을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다른 용도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을 때의 상태를 기준으로 새롭게 설치한 시설만 원상대로 복구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이 자신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가 서명한 계약서의 내용을 주목했습니다. A는 자신이 양수한 모든 시설을 철거하겠다는 특별한 약정을 체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A가 서명한 계약서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한 셈입니다. 커피전문점 철거 비용은 A가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A는 위 소송에서 B를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도 청구하여 일부 승소했지만, A가 이미 지급한 권리금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결국 권리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상회복 의무 위반으로 철거 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겁니다.
쉽게 회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되야
철거 및 원상회복의 범위도 문제입니다. 물론 임차인이 입주 당시 찍어 놓은 사진 등을 통해 원상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 문제로 설왕설래하다 결국 임대인은 철거 및 원상회복 비용 일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던 C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물 리모델링으로 인한 분쟁이 생기자, 임차인 C는 임대인 D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D는 C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다고 반소로 맞대응했습니다. 소송에서 D는 C가 두고 간 식자재 창고 및 구조물 철거 비용 등을 포함해 약 4,300만 원의 철거비용을 감정하여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냉동육절기, 냉장육절기 등 쉽게 회수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철거비용에 포함될 수 없고, 권리금 산정에도 포함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8690, 2021다298706 판결).
즉, C가 냉동육절기와 냉장육절기는 수거하여 다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까지 포함해 권리금이나 철거비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철거업체에 맡겼다고 해서 모든 비용을 일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도 철거비용을 선별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 임대차가 끝나면 원상복구 후 반환해야 한다.
- 기존의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계약이라면 전 임차인이 한 인테리어도 모두 철거해야 한다.
- 계약서에 임차인 지위 양도, 전부 철거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자.
#상가임대차
#시설권리금
#원상회복의무
#철거비
2025-01-28 출판
출처: 부동산법 설명서 - 임대차 편
출처: 부동산법 설명서 - 임대차 편
저자

김용우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손해배상 22
기타 민사사건 13
사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