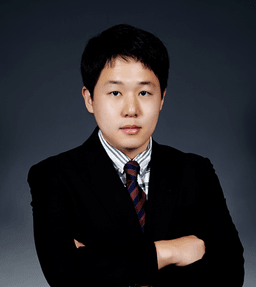임대차
원상회복 비용 분쟁에 따른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상회복 공사 중 바닥 콘크리트 훼손 문제로 공사 방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과도한 원상회복 비용 및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후 일부만 반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제된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적정한 원상회복 비용과 임차인의 지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6,688,8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만두, 밀가루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며 피고 소유의 건물을 임차했던 임차인)
- 피고: 주식회사 B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며 원고에게 건물을 임대했던 임대인)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만두, 밀가루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유의 건물을 임차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인 2023년 7월 30일 계약이 종료되었고, 원고는 원상회복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닥 콘크리트 훼손 복구 방법에 대해 원고는 콘크리트 폴리싱이나 셀프레벨링 방법을 제시한 반면, 피고는 콘크리트를 걷어낸 후 바닥을 포장하는 방식을 고집하며 공사비와 기간의 차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여 원상복구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3년 7월 31일 상가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했고, 피고는 2023년 8월 23일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중 1억 4천93만 5천 원만 반환하고 원상회복 비용 명목으로 상당액을 공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남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원상회복 공사의 범위와 적정한 비용,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및 그 범위, 그리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최종 금액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원상회복 비용과 임대차 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원상회복 공사 중 바닥 콘크리트 훼손 보수 방법으로는 ‘셀프레벨링(수평몰탈) 방법’이 적정하며 공사비는 17,883,967원으로 판단했습니다. 바닥공사를 위한 칸막이 및 샷시 철거·재시공, 스프링클러 교체, 칸막이 설치 공사는 원상회복 의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훼손된 유리, 벽면 교체, 천장 도장 공사, 출입문 및 샷시 복구 공사는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총 원상회복 비용은 44,285,842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무리한 요구로 원상복구 공사가 중단된 것은 피고의 변제 수령 거절에 해당하므로, 원상복구 의무 이행 지체 책임을 원고에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늦은 착공으로 인해 임대차 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23년 7월 31일부터 원상복구가 완료될 수 있었던 2023년 8월 18일까지의 19일간 차임 상당액 8,090,322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에서 총 원상회복 비용 44,285,842원과 손해배상금 8,090,322원을 공제한 197,623,836원을 반환해야 하며, 이미 140,935,000원을 변제했으므로 추가로 56,688,836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지연손해금으로 2023년 8월 26일부터 2024년 6월 27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56,688,8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8월 26일부터 2024년 6월 27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할 때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대차 계약서 제14조에 원상회복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고, 이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공사 방법, 비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의 범위를 판단하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복구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및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합리적인 원상회복 공사 방식을 거부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여 공사가 중단된 경우, 임대인의 변제 수령 거절로 보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지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원상회복 공사 늦은 착공으로 인해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차임 상당액이 손해배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임대인이 입을 수 있는 통상적인 손해에 해당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에서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을 적용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2%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참고 사항
- 임대차 계약 시 원상회복의 범위와 기준을 계약서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축신축 당시’와 같은 모호한 표현보다는 임차 시작 당시 건물의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명확하게 기록해 두어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 원상회복 공사 중 임대인과 이견이 발생할 경우, 불필요한 공사나 과도한 비용 요구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공사 방법과 비용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대인이 합리적인 원상회복 공사 제안을 거부하고 무리한 요구를 지속할 경우, 이는 임대인의 변제 수령 거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 지체 책임을 모두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내용증명 등을 통해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임대인이 실제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공사 착수 및 완료 기간을 최대한 지키고, 임대인 또한 부당한 요구로 공사를 지연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원상회복 공사 내용이나 비용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는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소송 제기 시 원금 외에 법정이자(상법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2%)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문 변호사
변호사김상문법률사무소 ·
경기 고양시
경기 고양시
전체 사건 120
임대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