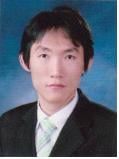채권/채무 · 행정
빚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재산 증여는 취소된다는 판결
채무자 C가 빚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을 피고 B에게 증여했으나, 채권자 A 주식회사가 이를 알아내 증여를 취소하고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C는 이미 2014년에 A 주식회사에 20,655,130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연 20%의 이자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C는 2016년 경주시 D 전 1,680m² 중 2/13지분(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이것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C는 2018년 9월 20일 유일한 이 재산을 피고 B에게 증여했고 2018년 10월 8일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C는 빚을 갚을 수 없는 무자력 상태가 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증여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C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C의 증여 행위를 취소하고자 소송을 제기한 원고입니다.
- C: A 주식회사에 20,655,130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이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 지분 2/13을 B에게 증여한 당사자입니다.
- B: C로부터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수익자이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입니다.
분쟁 상황
C는 2014년 A 주식회사에 대해 20,655,130원의 구상금 채무 및 연 20%의 이자 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판결은 2014년 6월 10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7월 17일 경주시 D 전 1,680m² 중 2/13 지분을 상속받았는데, 이 지분은 C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C는 2018년 9월 20일 이 유일한 지분을 피고 B에게 증여했고, 2018년 10월 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증여로 인해 C는 A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29,509,000원 이상의 채무를 갚을 재산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C의 증여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동산 등기를 원상회복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빚이 있는 사람이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여 채권자가 빚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증여받은 사람이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때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와 C 사이에 2018년 9월 20일 경주시 D 전 1,680m² 중 2/13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C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8년 10월 8일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C가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피고 B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무자력 상태)를 심화시켰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채권자인 A 주식회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증여받은 피고 B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C는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피고 B에게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A 주식회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해의사의 추정: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하거나 대부분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C가 원고에게 2,000만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유일한 재산을 증여했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도 그 사정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수익자 본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 B는 C의 채무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악의가 추정되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해당 재산은 채무자에게 다시 돌아가거나, 원상회복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C에게 이전받은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여 원상회복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하거나 대부분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법원에서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재산을 채무자의 소유로 돌려놓고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거나 양도받은 사람은 해당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재산을 받은 사람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재산이 오고 가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 증여 또는 양도 당시의 상황, 재산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행 변호사

추은혜 변호사
법률사무소 더든든 ·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전체 사건 248
채권/채무 76
행정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