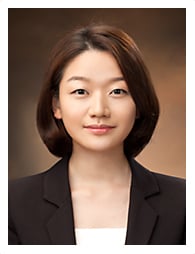기타 형사사건 · 노동
퇴직 근로자 임금 미지급 사건
개인 사업자인 피고인이 퇴직한 미장공 F에게 임금 390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F가 근로자가 아닌 하도급 관계였으며, 정산할 부분이 남아있어 임금 지급을 미룬 것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F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건은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장 공사 개인 사업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근로자 F와 B의 임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아 기소됨
- 근로자 F: 피고인 밑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390만 원을 받지 못해 고소했으며,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함
- 근로자 B: 피고인 밑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임금 150만 원을 받지 못했으나,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전북 지역에서 미장 공사를 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했습니다. 근로자 F는 2021년 4월 9일부터 2021년 10월 15일까지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피고인은 F의 2021년 4월 임금 120만 원을 포함해 총 390만 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F가 근로자가 아닌 하도급 계약자이며,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산할 부분이 남아있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퇴직한 미장공 F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는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하도급 관계' 및 '정산할 채권'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퇴직 근로자 F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사용자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임금 지급 의무를 게을리한 사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동시에 피해 근로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공소 기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퇴직한 F에게 임금 390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지급)은 임금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하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F에게 정산해야 할 채권이 있다는 주장은 이 원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은 제36조 또는 제43조를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제36조 또는 제43조 위반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합니다. 이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B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B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근로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일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고용 형태가 '하도급'이나 '도급 계약'인지 '근로 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 업무 내용,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일당제로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임금을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기반이므로 전액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중 일부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속하게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 변호사

김재희 변호사
변호사 김재희 법률사무소 ·
전북 전주시
전북 전주시
전체 사건 399
기타 형사사건 51
노동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