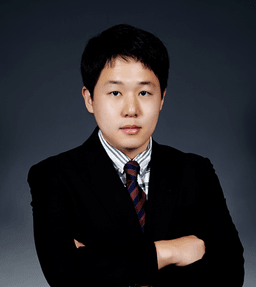임대차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임차인 사례
원고인 임차인 A씨가 피고인 임대인 D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D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거주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을 인도했습니다. D씨는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임차인입니다.
- 피고 D: 원고 A에게 건물을 임대해 주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았으며,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한 임대인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2020년 9월 18일 피고 D씨와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에 2020년 10월 8일부터 2022년 10월 7일까지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 8일 보증금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했습니다. 이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A씨는 2024년 3월 20일경 D씨에게 계약 해지와 함께 2024년 6월 20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2024년 8월 24일경 다시 계약 만기일에 종료하겠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11일 건물에서 퇴거하고 D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건물을 인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D씨는 A씨가 2024년 9월 13일경 1년 계약 연장을 원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와 이에 따른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보 후 건물 인도 시점과 임대인의 계약 연장 주장의 타당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씨는 원고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A씨가 건물에서 퇴거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건물 인도를 완료한 다음 날인 2025년 4월 12일부터 소송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5년 4월 15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임차인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임대인 D씨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확정했습니다. 임대인 D씨가 주장한 계약 연장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임대차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고, 이는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일 다음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갱신이나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하는 시점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건물 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를 들어, 열쇠 반납 확인서나 비밀번호 공유 기록 등)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는 구두보다는 서면 계약이나 명확한 메시지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