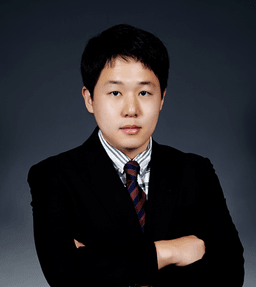기타 형사사건 · 노동
헬스장 트레이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헬스장 운영자인 피고인 A는 트레이너 D이 퇴직한 후 임금 7,504,853원과 퇴직금 17,340,1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D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부산 기장군에서 헬스장 ‘C’를 운영하는 사용자
- 트레이너 D: 2013년 11월 18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헬스장 ‘C’에서 트레이너, 팀장, 매니저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 ‘C’에서 2013년 11월 18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트레이너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5,000,000원, 연차미사용 수당 2,504,853원 등 총 7,504,853원과 퇴직금 17,340,177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트레이너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과 벌금 300만 원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트레이너 D이 헬스장 운영자 피고인 A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 관계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D의 근로자성을 인식하고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량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며, 핵심 쟁점은 D이 이 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은 D의 휴무 및 출퇴근 시간 관리, 피고인의 지시로 일반 업무 수행, 고정 기본급과 성과급 형태의 PT 수당 지급, 운동기구 등 장비 제공, 피고인의 다른 지점 업무 지시, 단체 카톡방을 통한 출퇴근 보고 및 근무시간 관리 등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D이 피고인에게 종속된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고용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내용,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 여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이나 장비 제공 여부, 보수의 성격(고정 기본급 및 성과급 비중), 노무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판단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부터 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의무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서면으로 합의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 변호사
배수민 변호사
배수민 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부산 연제구
전체 사건 253
기타 형사사건 43
노동 4




.jpg&w=256&q=85)

.jpg&w=256&q=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