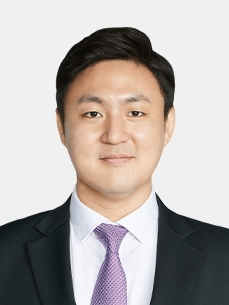폭행 · 협박/감금 · 기타 형사사건
삼촌 부부가 조카 집 찾아가 협박하고 돈 요구한 사건
피고인 A와 그의 아내 B는 사망한 A의 형(피해자 C와 D의 아버지)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조카들이 상속받아 처분한 것에 대해 자신들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조카들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받아낼 목적으로, 조카 C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여러 차례 무단으로 침입하고, 조카 D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동주거침입 및 공갈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C와 D의 삼촌이자 피고인 B의 남편. 사망한 형의 부동산 처분 대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공갈미수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B: 피해자 C와 D의 숙모이자 피고인 A의 아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 C: 피고인 A의 조카. 피고인들로부터 주거침입 피해를 입음.
- 피해자 D: 피고인 A의 조카. 피고인 A로부터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받아 공갈미수 피해를 입음.
- 피해자 C, D의 부친 E: 피고인 A의 형이자 사망자.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원래 등기 명의자.
- 피해자 C의 처 H: 피해자 C의 아내. 피고인들의 주거침입 당시 집에 있었음.
- 피고인 A의 모친 G 및 8명의 형제자매: 분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주장의 당사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C와 D의 삼촌으로, 사망한 형 E 명의의 부동산이 사실은 부친이 형 E에게 명의신탁했던 것으로 자신을 포함한 8명의 형제자매 및 모친 G의 공동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이 2016년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아 처분하자, 피고인 A는 2016년 9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2018년 9월 28일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부동산 처분 대금 중 일부를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9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피해자 C의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통과하여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번호키를 누르며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총 4회에 걸쳐 공동주거침입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8년 9월 27일부터 2019년 7월 3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D에게 "7형제의 토지를 되찾기 위해 C 집에 직접 찾아가 행동할 예정이다", "할머니가 생전에 청구한 금액이라도 보상해주면 모든 걸 끝내겠다", "나의 손발 마비가 풀리는 시기와 내 명령만 기다리는 형제도 있지 않겠느냐"는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부동산 처분대금 중 일부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갈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으며,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여러 차례 침입한 사실을 피해자 C의 일관된 진술, 112 신고 내역, 경찰관의 경고 사실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관련 민사소송 패소 후의 상황, '행동', '극한수단' 등의 문구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해악에 이르게 할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공갈미수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가 주장한 권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권리 실현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공갈미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및 형법 제319조 제1항 (공동주거침입): 여러 명이 공동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A와 B 부부가 피해자 C의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지나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이 이에 해당하여 공동주거침입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공갈미수):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죄의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명시적이지 않아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이 해악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보낸 '극한수단', '행동할 예정' 등의 문자메시지가 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와 같이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공동주거침입과 공갈미수), 각 죄에 대해 정한 형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본 사례에서는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해당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노동을 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형의 집행을 위해 일정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경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라 할지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최종 판결이 내려진 후에는 그 판결을 존중해야 합니다. 패소 후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 하거나 상대방을 압박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주거는 법률로 보호받는 공간이므로, 타인의 동의 없이 주거 공간(아파트의 경우 공동현관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포함)에 침입하거나 문을 강제로 열려 시도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 '극한수단', '형사고발 준비 중'과 같이 상대방에게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시적인 위협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해악을 인식하게 할 수 있다면 성립됩니다. 설령 본인이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괴롭힘을 넘어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12 신고 등을 통해 초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 변호사
김보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목 ·
부산 연제구
부산 연제구
전체 사건 576
폭행 48
협박/감금 29
기타 형사사건 95



.jpg&w=256&q=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