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사 모두 '이대로는 부족' 외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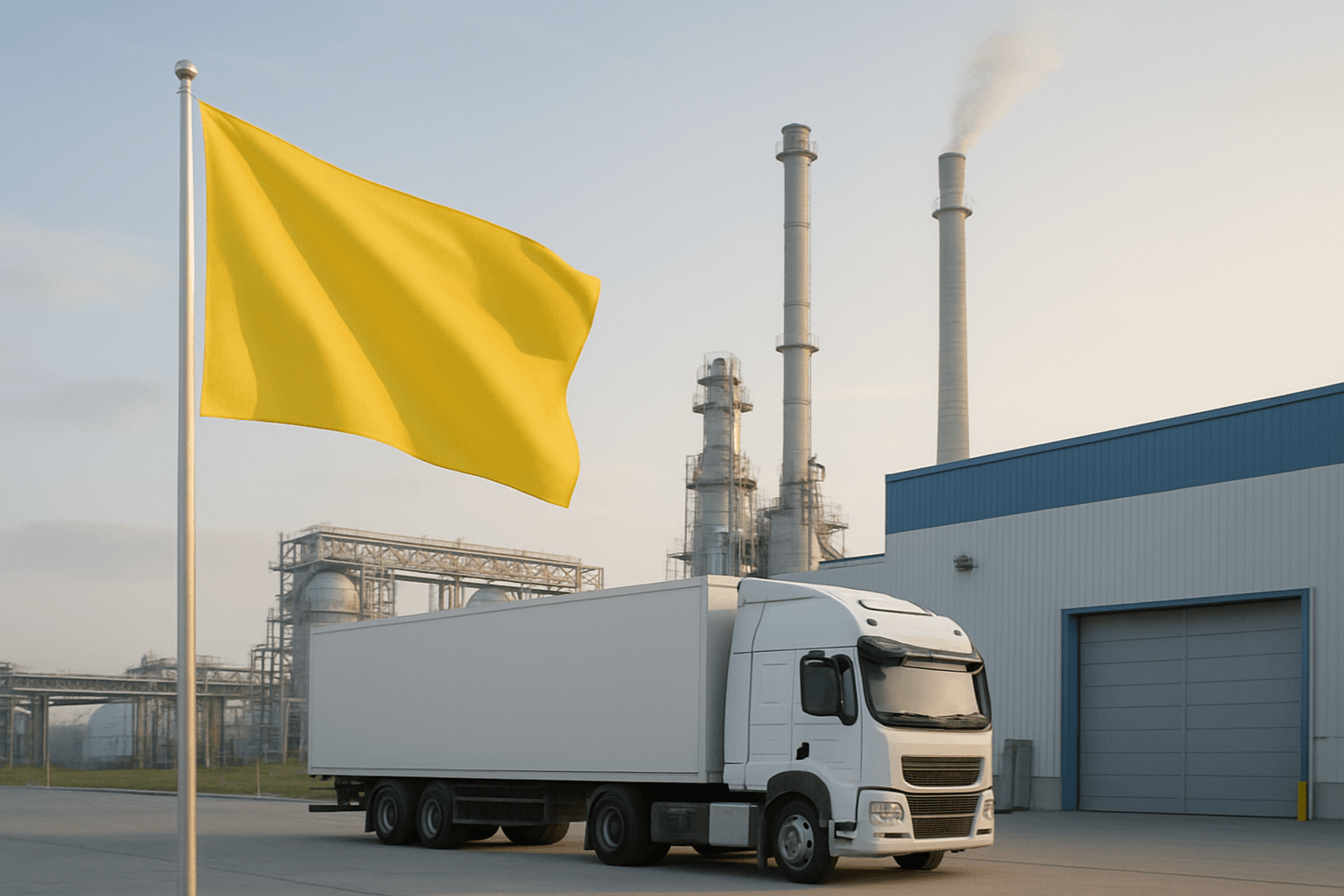
노란봉투법이 뭔데 뭘 논란 삼아?
노란봉투법, 이름부터 귀엽고 따뜻한 느낌인데 사실 그 유래는 꽤 무거워요.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떨어졌을 때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에 돈을 모아서 보냈던 데서 시작됐답니다. 그래서 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도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죠.
그런데 왜 모두가 못마땅하다고 하지?
법안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양쪽 모두 "이건 아직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노동계에서는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절차분쟁을 키울 수 있고 노동자들이 20년 넘게 싸워온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반발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법률이 기업들 사이에 혼란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시행령 입법 예고안, 성질급한 구두계약?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월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은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 지배력'으로 규정하는데, 이게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또 사용자가 판단받는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린 것도 너무 짧아 실질적 검증이 어렵다고 하네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편하다 불편하다 사이
사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과거 복수노조 설립 금지를 뒷받침하는 장치로 도입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단체교섭의 자유를 막는 족쇄가 될 수도 있어요. 법학자도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할 만큼 논란 많은 부분입니다.
결국, 노란봉투법 보완에 정치권도 전문가도 머리 싸매는 중
시행령만으로 한계가 분명하다 보니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법률과 시행령의 미비점을 꼼꼼히 점검하고, 노사 양측이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심도 깊은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처럼 법령 하나도 제대로 다듬는 데는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절차가 얽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죠.
앞으로 여러분이 노사 분쟁이나 노동 기본권 관련 법률을 접할 일 있다면 이번 노란봉투법 이슈가 좋은 참고사례가 될 거예요. 법안 하나가 만들어지고 시행되기까지 얼마나 꼼꼼히 따져야 하고, 제대로 된 법률 문구 하나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