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주택? 청년들의 보증금은 어디로? ‘근심주택’ 현장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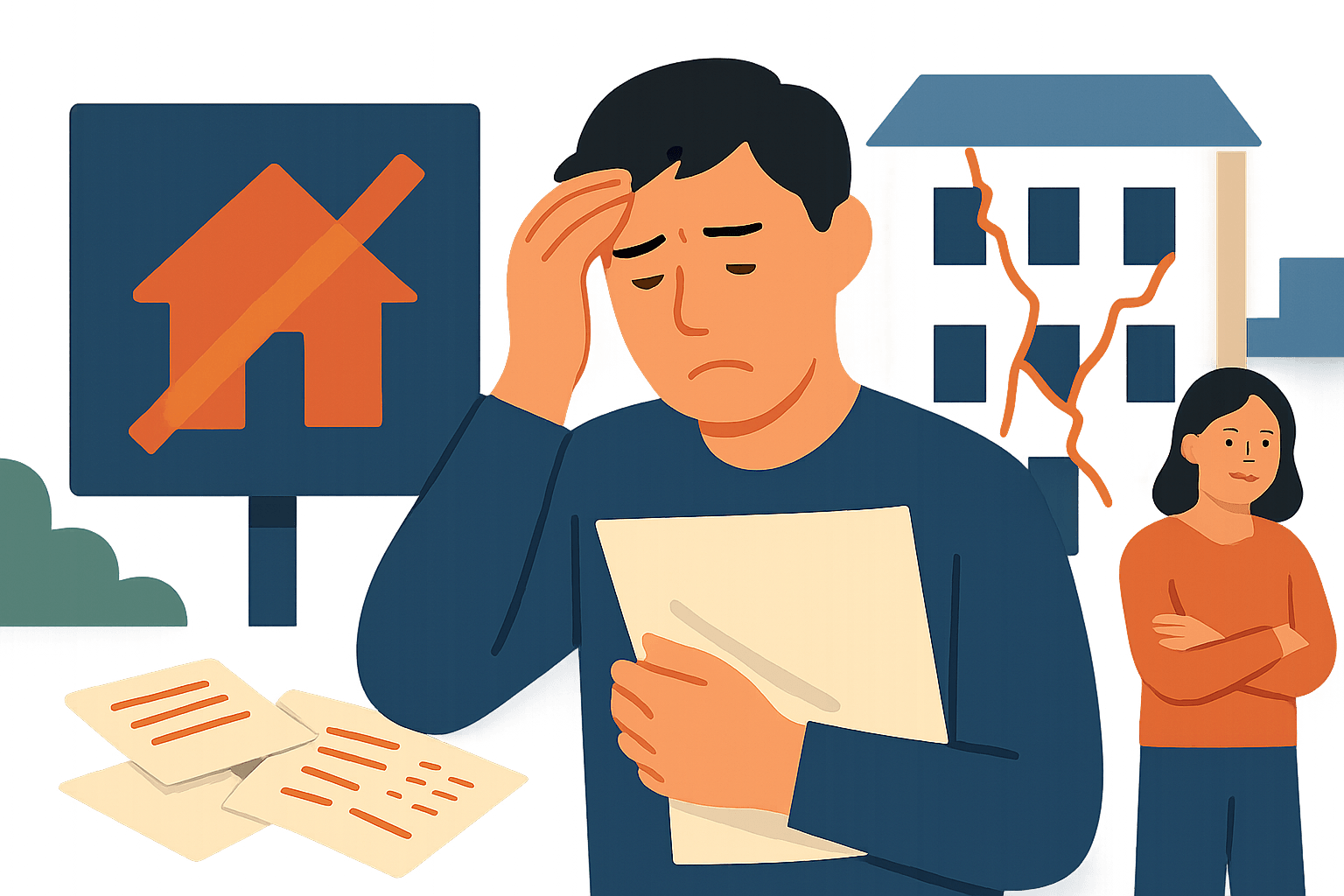
청년안심주택, 이름만 믿었는데…
‘청년안심주택’이라 불리던 서울시 프로젝트가 사실상 ‘근심주택’으로 변질됐다는 소식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했던 이 사업에서 벌어진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무려 23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내고 있어요. 이름만 ‘안심’이지 속을 들여다보니 실상은 완전 다르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보증금이 사라진 데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우선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홍보만 하면서 실제 권한과 책임은 부족했던 점, 그리고 민간 자금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며 공공출자가 거의 없는 금융 구조가 문제였어요. 주택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사업자가 임대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과 검증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점도 큰 원인입니다.
피해는 누가 입나요?
청년 세입자들, 바로 이 사업의 수혜 대상자들이죠.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청년안심주택 중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가 전체의 약 12%에 달합니다. 대표적으로 잠실 센트럴파크와 사당 코브 지역에서 세입자들이 엄청난 보증금 피해를 봤는데요. 잠실 센트럴파크만 해도 강제경매에 들어가면서 228억원이나 위험에 처했습니다.
대처 방안은 있을까요?
민간 임대 중심 구조를 유지하려면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절차와 함께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공공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어요. 세입자 스스로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사태를 보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멋진 슬로건에 숨겨진 복잡한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명확한 책임 소재 없이 대규모 공공임대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면 결국 세입자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의 애매한 역할에 의해 도리어 청년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감독’이라는 단어가 실체가 되게 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