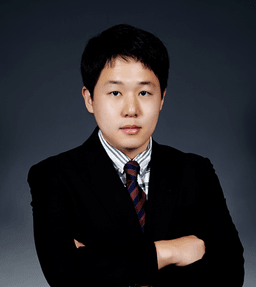임대차
임대차보증금 및 원상복구비 반환 분쟁 사건
임차인 A, B는 임대인 C와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월차임 5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들은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고 임대인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임차인들이 이사한 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며 원상회복 비용과 묵시적 갱신에 따른 추가 차임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원상회복 비용 중 일부만을 공제하고 추가 차임 등의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B: 임차인(세입자), 피고 C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던 사람들.
- C: 임대인(집주인), 원고 A,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해 준 사람.
분쟁 상황
원고들(임차인 A, B)은 피고(임대인 C)와 2020년 12월 14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50만 원으로 2021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 12월 7일경 원고들은 임대차 계약을 2023년 2월 1일까지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했고 피고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원고들은 2023년 2월 1일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했으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 비용 7,997,115원과 묵시적 갱신에 따른 추가 월차임 및 관리비 1,500,000원, 300,000원, 그리고 감정비의 절반인 3,410,000원을 주장하며 공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및 지연손해금 반환을 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상복구비 등 186,792,48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의 적법한 종료 시점,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 및 금액, 임대인이 주장하는 원상회복 비용의 공제 타당성 및 구체적 범위, 묵시적 갱신 주장에 따른 추가 월차임 및 관리비 지급 의무 발생 여부, 감정비용 등 소송비용의 부담 주장의 타당성.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2023년 2월 1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임대인 C)는 원고들(임차인 A, B)에게 198,253,7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2월 25일부터 2024년 4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상복구비용에 대해서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2,386,242원이 소요되나, 임차인들의 임의 원상회복으로 임대인이 얻은 가치상승 이득 640,000원을 제외한 1,746,246원만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인의 묵시적 갱신 주장 및 이에 따른 추가 차임과 관리비 지급 의무 주장은 임대차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감정비용은 소송비용의 일종으로서 별도의 절차에서 산정되므로 임차인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임대인 C는 임차인 A, B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서 원상회복 비용 1,746,246원을 제외한 198,253,758원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묵시적 갱신 및 추가 차임, 관리비, 감정비용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 계약의 기본적인 효력 및 의무에 대한 규정입니다.
- 민법 제639조 (묵시의 갱신):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보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계약 종료 전 명확한 의사 표시와 동의가 있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는 훼손은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차인의 원상회복으로 인해 임대인이 가치 상승 이득을 얻은 경우 보증금 공제 시 해당 가치 상승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에 대해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연 5%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산정에 적용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 이행 판결 시 채무자가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 5%를 적용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높은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하고 서면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이 종료 의사를 밝히고 임대인이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어 묵시적 갱신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나 훼손이 아닌,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부분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으로 임대인이 가치상승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공제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 시작 및 종료 시점의 부동산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임차인은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정비용과 같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부담 비율이 정해집니다.
수행 변호사
안정근 변호사
지정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전체 사건 11
임대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