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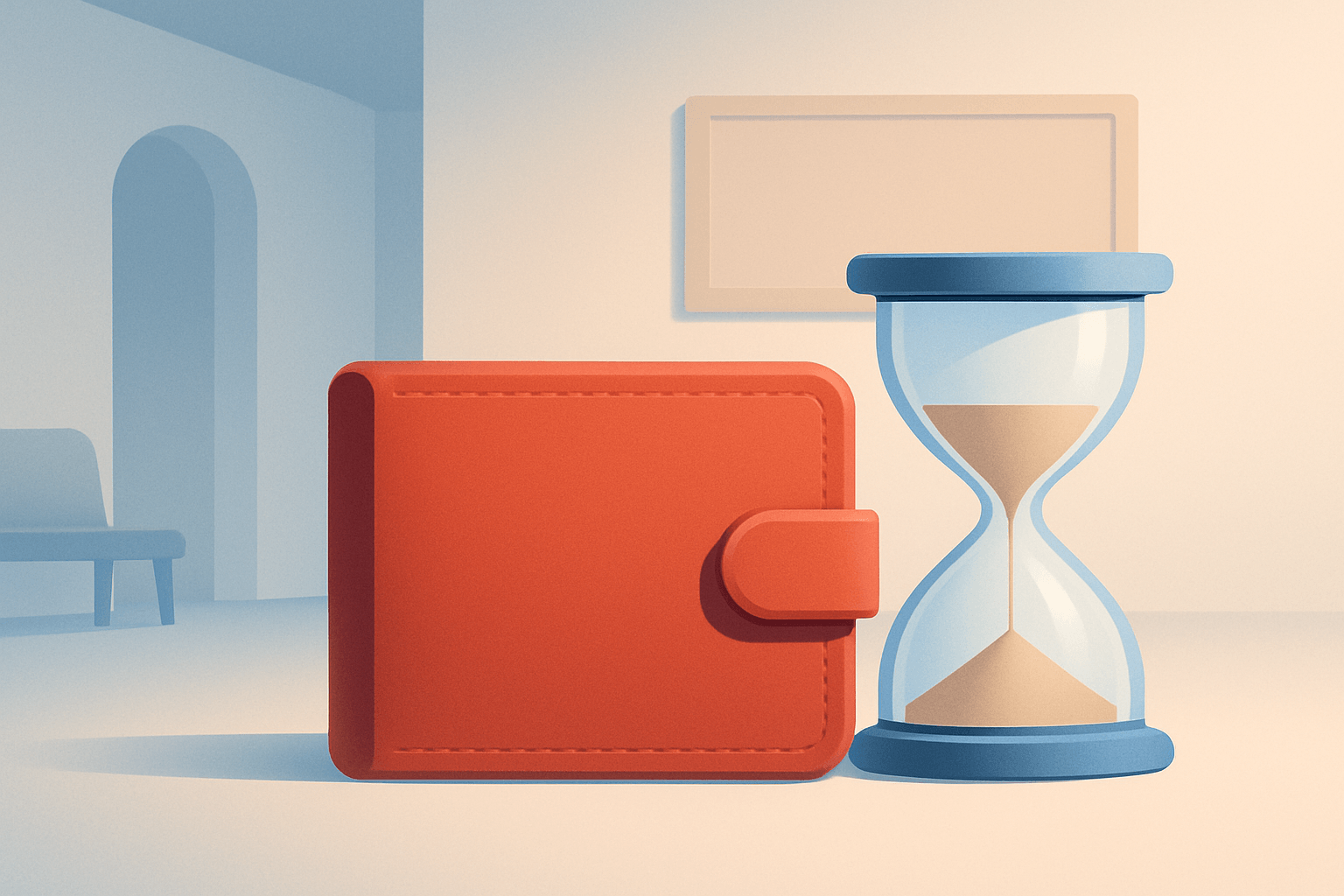
한국이 빠른 고령화 속에 접어들면서 60세 법정 정년과 65세 국민연금 수급 사이에 4~5년간 소득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 시기는 직장 생활을 마친 후 노후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아무런 소득이 없는 기간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 절벽’이라고 부를 만하죠.
OECD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의 무려 2.5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노년 빈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근로 기간이 줄어 이 사이에 생기는 빈곤 위험을 막을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이유입니다.
단, 65세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기업들도 상당한 비용 부담을 감당해야 해요. 호봉제가 여전히 기업 임금체계의 대세라 근속이 길어질수록 인건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65세 정년 연장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약 30조 2000억원, 이는 25~29세 청년 약 90만명 고용할 수 있는 규모라는데요.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요소가 다분하니 사회 전반의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수입니다.
당장 60세 이후부터 65세 연금 수급 전까지의 ‘소득 공백의 계곡’을 어떻게 메울지가 급선무입니다. ‘65세 정년연장’도 물론 중요한 주제지만 그걸 단독으로 밀어붙이기엔 현실적 난제가 많아요.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충분히 협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5년을 건널 다리놓기’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2050년이면 전체 인구의 40%가 노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선, 지금 대응안 마련이 늦으면 미래 세대에 부담이 가중되는 건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빈곤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 문제입니다. “내가 좀 참으면 되지”라는 식의 개인 책임 전가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시대, 정년 문제와 노년 빈곤 사이 숨겨진 ‘법과 제도의 빈틈’을 꼭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