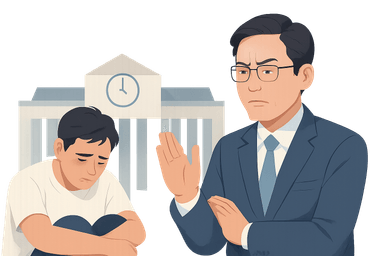통신사 해킹 국감 대폭발! '알면서 못 막았다?' 책임 공방 현장

허술한 보안에 국민 피해까지…통신3사 대표 국감장 출동
최근 대형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대표가 모두 출석해 질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KT의 김영섭 대표가 '책임지겠다'며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모든 비판이 KT에게 집중되었습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심하게 자유롭지 못했으나, 사건의 무게는 가벼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 커지는데 '늑장·은폐' 발표에 분노 폭발
KT는 당초 발표했던 불법 펨토셀(초소형기지국) 개수가 2개에서 결국 20개로 늘었고, 피해자 수는 278명에서 36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끝나지 않는 피해 조사에 피해 규모만 커지는 것은 무능하거나 거짓 때문 아니냐”며 김영섭 대표에게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대표마저 고개 숙인 KT의 늦장 대응
2020년부터 2023년까지 KT를 이끈 구현모 전 대표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사과한다"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펨토셀 부실 관리만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며 통신사 간, 국가 차원의 촘촘한 보안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LG유플러스도 '은폐 의혹'에 집중 포화
LG유플러스는 최고 권한 계정 관리 시스템(APPM)이 해킹당했고, 관련 서버를 급히 폐기했다는 의혹이 국감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서버 운영체계 재설치 시점과 당국 신고 내용이 상이해 "포렌식 증거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수사 의뢰 요구가 거론됐습니다. CEO 홍범식 대표는 "신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SK텔레콤은 위약금 관련 해명도 불충분
SK텔레콤은 사고 후 위약금 부담 비용을 당초 7조원으로 발표했다가, 실제는 약 7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역시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 투명성과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입니다.
보안 기업 SK쉴더스까지 뚫리다니…정부 책임론 급부상
보안 전문기업 SK쉴더스마저 해킹당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 신고 의무 강화와 정부 직권 조사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 보상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중소기업 해킹 피해 경고에도 여전히 미비한 대응
중소기업 77%가 랜섬웨어 등 보안 피해를 경험했음에도 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에 가입한 기업은 5000개에 불과해 '보안 사각지대'가 크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현실과 법적 규제 사이 괴리가 존재할 시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