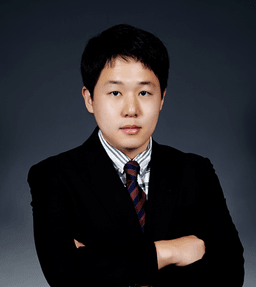행정
인터넷 음란 메시지 전송 처벌 조항 합헌 결정 사건
이 사건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툰 헌법소원심판입니다. 두 명의 청구인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표현의 자유, 평등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 청구인은 법원의 기록 등사 불허 결정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다른 청구인의 일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박○○: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보낸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박□□: 페이스북 메신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보내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법률 조항과 재판 관련 기록 등사 불허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청구인 박□□가 과거 약식명령을 받았던 사건의 기록 등사 신청을 불허한 피청구인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라는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해당 조항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만을 처벌하고 다른 음란행위와 비교하여 형벌의 체계균형성 내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사전검열금지원칙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에 대한 기록 등사 불허 결정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청구인 박○○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청구인 박□□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이라는 용어가 다양한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는 공익이 크며, 통신매체의 특성상 음란 표현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어 이를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벌의 체계균형성 및 평등원칙과 관련해서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가 대면 음란행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합리적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사전검열금지원칙 침해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의 기록 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 주장을 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민수 변호사
변호사박민수법률사무소 ·
전북 전주시
전북 전주시
전체 사건 971
행정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