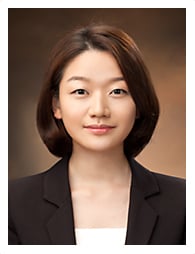노동
화장품 판매 사업국장의 퇴직금 청구 불인정 판결
화장품 제조 및 판매 회사와 판매위임계약을 맺고 사업국장을 맡았던 원고가 자신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의 종속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와 판매위임계약을 체결하고 'C' 강남지점의 책임자인 '수석사업국장'으로 일했던 사람
- 피고 주식회사 B: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며 'C'라는 영업판매조직을 운영하는 회사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9년 10월경 피고 B 회사와 화장품 판매위임계약을 맺고 'C' 강남지점의 수석사업국장으로 일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2월경 강남지점의 매출 부진을 이유로 사업장 면적을 축소했고, 2019년 3월에는 강남지점을 선릉지점으로 통폐합하겠다고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9년 4월 3일 피고에게 판매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경쟁업체 이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원고의 예하 판매원의 허위 매출에 대한 연대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비록 판매위임계약 형태였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 회사와 판매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일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을 청구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중시합니다. 즉,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 근무 시간 및 장소 구속: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았는지.
-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근로제공자가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는지. 이윤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는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 기타: 근로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판매위임계약이 상법상 '대리상'(상법 제87조, 제89조, 제92조의3)과 '위탁매매인'(상법 제101조, 제103조, 제106조) 계약의 성격을 일부 혼합한 것으로 보았고, 원고가 사업계획 수립, 하위 판매원 모집 및 관리, 매장 운영 경비 및 판촉 활동 비용 부담 등에서 독립적인 사업자의 모습을 보였으며, 보수 역시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되어 고정급의 성격이 약하고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구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출 관리 및 보고 의무는 상법 제112조(대리상의 보고의무) 및 민법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에 따른 의무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개인이 회사와 맺은 계약의 명칭이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에는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업무 지휘·감독 여부: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중요합니다. 단순히 매출 보고나 판매 독려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무 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회사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출퇴근을 통제하는 등 구속력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독립성 여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를 소유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아니면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 성격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여부도 참고 사항입니다.
- 기타: 근로 관계의 계속성과 회사의 전속성(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없는 정도),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4대 보험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할 권리가 있었으며, 매장 운영 경비와 판매촉진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점, 보수가 판매 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월별 편차가 컸던 점 등이 독립적인 사업자로 판단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범준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전체 사건 55
노동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