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군인 순직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과 시효 소멸 판단 사건
이 사건은 공무 중 순직한 군인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와 자녀에서 부모로 변경되었을 때, 변경된 유족(부모)의 연금 수급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다룹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순차적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자, 망인의 부모가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을 청구했지만, 국군재정관리단장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족연금수급권이라는 '기본권' 자체는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다만 그 기본권으로부터 매달 발생하는 '월별 수급권'에 대해서만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법원이 유족연금수급권 전체가 소멸시효로 소멸했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상고인): 순직 군인의 부모로,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피상고인): 국군재정관리단장으로, 원고의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를 소멸시효를 이유로 거부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망인: 공무수행 중 순직한 육군 소령입니다.
- 소외 3: 망인의 배우자로, 2006년 3월 30일 재혼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했습니다.
- 소외 4: 망인의 아들로, 2009년 10월 22일 18세가 되어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했습니다.
분쟁 상황
1992년 9월 14일 공무 중 순직한 육군 소령의 유족연금은 처음에는 배우자인 소외 3이 1992년 10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수령했습니다. 이후 소외 3이 2006년 3월 30일 재혼하여 연금 수급권을 상실했고, 다음 수급권자인 아들 소외 4는 2009년 10월 22일 18세가 되어 수급권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순직 군인의 부모인 원고와 소외 2는 2016년 7월경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자신들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을 이전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아들 소외 4가 수급권을 상실한 2009년 10월 22일부터 군인연금법이 정한 5년이 지났으므로 부모의 유족연금수급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아, 2016년 7월 22일 원고와 소외 2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부모는 이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선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여 차순위 유족에게 수급권이 이전되었을 때, 차순위 유족이 취득한 유족연금수급권이 구 군인연금법상 5년의 소멸시효 대상인지, 그리고 원고의 유족연금수급권이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유족연금수급권'을 전체 기본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매달 지급되는 '월별 수급권'으로 구분하여 볼 것인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유족연금수급권 전부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한 것은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의 취득, 이전 및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군인이 사망하여 발생하는 유족연금수급권이라는 '기본권' 자체는 국방부장관의 지급 결정으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면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선순위 유족이 수급권을 상실하여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에게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족연금 제도의 입법 취지가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미 누군가가 권리 행사를 시작한 연금에 대해 수급권자 변경으로 인해 기본권 전체가 소멸시효로 사라진다고 보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유족연금수급권으로부터 매달 발생하는 '월별 수급권'은 각 연금 지급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청구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월별 연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연금수급권 전부가 시효로 소멸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며, 월별 수급권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파기 환송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군인연금법(2013년 3월 22일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조항들을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제3조 제1항 제4호: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 중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유족'은 군인 사망 당시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말합니다. 이는 유족연금 지급의 기본적인 요건과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
군인연금법 제12조: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유족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군인연금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재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가 18세에 달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권을 상실할 경우, 그 권리는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이전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단순히 새로운 권리 부여가 아니라 선순위자가 상실한 권리가 법률에 의해 그대로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월별 수급권'에 대해서는 '매달 연금지급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개별 월별 연금액에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군인연금법 제1조: 군인연금 제도의 목적이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에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유족연금수급권 기본권의 소멸시효를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및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에 대한 거부 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하여 대법원은 유족연금수급권의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기본권)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월별 수급권'을 구분하고, 기본권은 독립적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며 월별 수급권에 대해서만 5년 시효가 적용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족연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 수급권자 변경 시 권리 이전 여부와 소멸시효 적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이라는 큰 틀의 권리(기본권)는 한 번 발생하면 쉽게 소멸시효로 사라지지 않지만, 매달 지급받을 수 있는 개별적인 연금액(월별 수급권)은 각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급권자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 권리 이전을 청구하여 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청구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지난 5년간의 연금은 받을 수 있으니, 권리 상실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고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전 청구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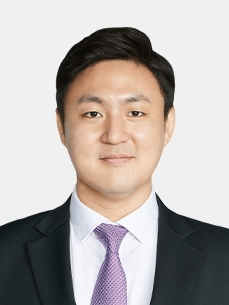
이응돈 변호사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전체 사건 105
행정 7





-%EA%B3%A0%ED%99%94%EC%A7%88.jpg&w=256&q=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