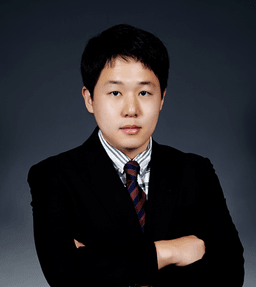기타 형사사건 · 노동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퇴직금 미지급 분쟁 사건
미용실 운영자 A가 과거 헤어디자이너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D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D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A에게 부과된 벌금 150만 원의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용실 'C'의 운영자이자 사용자
- D: 피고인 A의 미용실에서 근무했던 헤어디자이너 (근로자성 인정)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미용실 'C'를 운영하는 사장으로, 헤어디자이너 D는 2014년 10월부터 2020년 2월경까지 이 미용실에서 근무했습니다.
D는 주 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고정된 시간에 근무했으며, 외출이나 결근 시에는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월 220만 원에서 230만 원의 고정급을 받았고 초과근무 시 추가 수당도 지급되었습니다.
D는 자신의 가위나 헤어롤 등 일부 개인 도구를 사용했지만 시술 제품이나 미용 기계는 미용실의 것을 사용했고, 개인적으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대신할 제3자를 고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고인 A는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D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헤어디자이너 D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만 원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A는 D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설령 의무가 있더라도 벌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벌금 150만 원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헤어디자이너 D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원심의 양형 또한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D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고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며, 핵심 법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 판례(2021다222914 판결 등)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다음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D가 고정된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고정급을 받았고, 독립적인 사업 운영의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D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식적인 계약서 내용이나 세금 처리 방식 등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실질적인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보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개인 사업장에서 고용되는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관계는 외형상 계약 형태보다 실제 업무의 내용과 방식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휘·감독 여부: 사용자가 근무 시간, 장소,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독립성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를 소유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이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또는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속성 및 계속성: 한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며 해당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강할수록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소득세 원천징수 형태(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형식적 요소보다는 실질적 지배력과 종속성이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사정을 들었음에도 법원은 이를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의 실질적 내용과 종속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유사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수행 변호사
김태용 변호사
법무법인에이파트 수원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경기 수원시
전체 사건 117
기타 형사사건 8
노동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