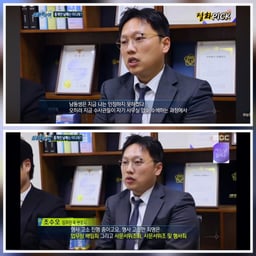행정 · 기타 형사사건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다시 청구했으나 각하된 사건
청구인이 건조물침입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된 전례가 있어 다시 청구한 이번 심판도 동일한 이유로 부적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안○○: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에게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주체
분쟁 상황
청구인 안○○은 2019년 7월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0년 9월 30일 헌법재판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년 10월 20일 기소유예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다음날인 2020년 10월 21일 "기소유예 처분 취소의 조건인 '사건 발생 1년 이내'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이유가 없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전에 각하된 헌법소원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합니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전에 제기한 헌법소원이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된 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다시 한 것이므로,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며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기간):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기소유예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첫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각하되었고, 이후 재차 청구한 심판에서도 이 청구기간 준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일사부재리 원칙):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이미 같은 내용으로 심판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한번 판단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이미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이 원칙에 위배되어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제소기간의 예외):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행정소송법이 준용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미성년자 신분이나 대입 준비 등은 청구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도 가능하지만, 재심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며, 단순히 이전 결정의 내용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판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됩니다. 이미 법원에서 확정되었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거쳐 각하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실이나 법리적 주장이 없는 한 다시 심판을 청구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유가 미성년자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며, 청구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방해 사유가 명확하게 존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이유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대리인(국선대리인 포함)이 청구인의 주장을 추인해야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청구인의 모든 주장을 추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리인이 제출한 청구서의 내용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수행 변호사
김현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
전체 사건 135
행정 24
기타 형사사건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