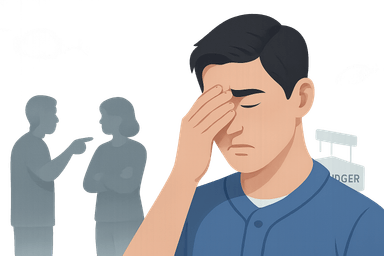채권/채무
빚을 갚지 않고 부모에게 재산을 넘긴 채무자의 증여 취소 사건
원고 A가 채무자 D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D가 자신의 부모인 피고 B, C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증여 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D의 증여 행위로 인해 D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사해행위가 인정되고, D에게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D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C: 채무자 D의 부모이자 D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들입니다.
- D: 원고 A에게 채무가 있는 사람으로, 부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재산이 부족해진 채무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9월 11일부터 2022년 12월 22일까지 D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2023년 1월 3일, D는 원고 A에게 6,000만 원을 2023년 1월부터 매월 50만 원씩 120회 분할 상환하고,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선 2021년 12월 27일, D는 자신의 소유이던 부동산을 부모인 피고 B와 C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맺고, 2021년 12월 29일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증여 계약 당시 D는 적극재산으로 증여한 부동산 외에 전남 무안군의 토지 1/4 지분(시가 824만 2천 5백 원 상당)과 아반떼 차량(시가 1,5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F조합 대출금 2,700만 원과 원고 A에 대한 차용금 약 2,800만 원(증여 시점의 채무액)이 있었습니다.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그 외의 다른 재산으로는 자신의 모든 채무를 갚기 어려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D의 증여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채무자 D가 자신의 부모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원고 A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증여 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D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인 부동산을 부모인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를 초과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 A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D에게는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과 D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D에게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명의신탁'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 D의 부모인 피고들에게 이루어진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D가 부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대상이 됩니다.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가 더 악화되어 채권자가 충분히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의사의 추정: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나 대부분의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특히 타인에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간주되며, 이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본 판례에서도 D가 부동산을 부모에게 증여한 행위에서 사해의사가 추정되었습니다. 원상회복: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그 행위로 인해 넘겨진 재산은 채무자에게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D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을 D의 재산으로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그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대부분의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가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으므로, 재산을 받은 사람은 명확한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될 위험이 큽니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충분했더라도, 이후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그 재산 처분은 거의 대부분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하려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기원 변호사
법률사무소기원 ·
광주 동구
광주 동구
전체 사건 1,047
채권/채무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