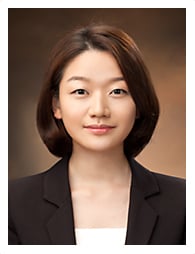기타 형사사건 · 노동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의 항소심
K 주식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상시 근로자 90여 명을 고용하며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퇴직 근로자 100여 명에게 총 8억 원 이상의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하거나 표시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K 주식회사 대표 A): 상시 근로자 약 9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던 회사 대표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 피해 근로자들 (S, Q, O, R, L, M 등 총 100여 명): K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법정 기한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철회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3년 5월부터 2016년 2월경까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합의 없이 근로자 M을 비롯한 총 100여 명의 근로자에게 총 8억 6천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하는 등의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철회한 경우,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공소 유효성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의 범위 및 수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직접 양형조사를 통해 확인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공소가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근로자(2016고단3099호 중 S, Q, O, R, BQ, BR, BS, BT에 대한, 2017고단509호 중 N, AV, AT, BE, BF, AZ, BA, BJ, BI, BG, AQ에 대한)들은 공소 제기 후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근로자 58명에 대한 총 7억 7천6백만 원 이상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체불임금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 근로자 수가 많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약속하거나 약 1,968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58명에게 총 7억 7천만 원 이상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해당 공소는 기각되었으나, 상당수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히 그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 조항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역시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위 근로기준법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조항들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는 법원이 기각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 여부가 소극적 소송 조건으로서 직권 조사 사항이라고 보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
대법원 판례 (2001도4283 등):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교부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권한을 수여한 경우,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된 것으로 봅니다.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0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 각 죄에 대해 정한 형의 범위 내에서 여러 죄를 합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알아두면 좋을 사항들입니다:
-
사업주 입장: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명확한 합의를 거쳐 서면으로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체불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 근로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여 일부라도 변제하는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입장: 퇴직 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과 같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철회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의 이해: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해자가 대리인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대리권이 적법하게 부여되었다면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더든든 ·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전체 사건 191
기타 형사사건 27
노동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