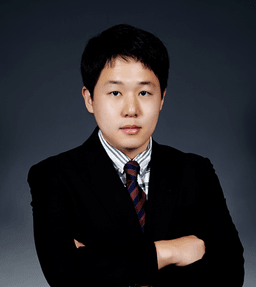노동
공사 현장 추락 사고에 대한 건축주 책임 여부 사건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붕 마무리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시저리프트에서 약 3미터 높이로 추락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고, 건축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또는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약 2억 9천 3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건축주가 공사 전체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 시공하게 했고,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건축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나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붕 작업 중 시저리프트 추락 사고로 중상을 입은 근로자입니다.
- 피고 B: 양주시에 위치한 공장 신축 공사의 건축주입니다.
- D (E 건설): 피고 B로부터 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원고 A를 고용한 건설업자입니다.
분쟁 상황
2017년 9월 1일, 양주시에 위치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붕 마무리 작업을 하던 원고 A는 렌탈 장비인 시저리프트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시저리프트가 넘어지면서 약 3미터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골반, 늑골, 요추, 경골 하단 등 다발성 골절 및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급여 56,059,240원, 휴업급여 58,320,430원, 장해급여 68,656,500원을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사고의 책임이 공사 건축주인 피고 B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293,016,226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건축주 B가 사고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건축주 B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인 건축주 B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공장 신축 공사 전체를 건설업자 D에게 도급하여 시공하게 했고,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 B를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공사 전체를 도급주었으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또는 '전문분야 공사를 전부 도급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사고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전부 개정 전)을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 (사업주의 정의):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건축주가 건물 신축 공사 전부를 건축업자에게 도급주어 시공하지 않고,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일부 공사를 직접 시공할 경우에만 건축주가 이 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고 건축주는 사업주로 인정되지 않아 이 조항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업주가 작업을 할 때,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거나, 전문 분야 공사를 전부 도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건축주가 공사 전체를 한 명의 건설업자에게 도급주었으므로, 이 조항의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건축주가 공사 전체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맡겨 시공하고,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공사 과정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또는 '도급인'으로서의 직접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공사 계약 시 시공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사 전체를 일괄 도급하는지, 아니면 일부를 직접 시공하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비록 건축주가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사업주나 관련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해당 인물이 법적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수행 변호사

심승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심 ·
서울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
전체 사건 213
노동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