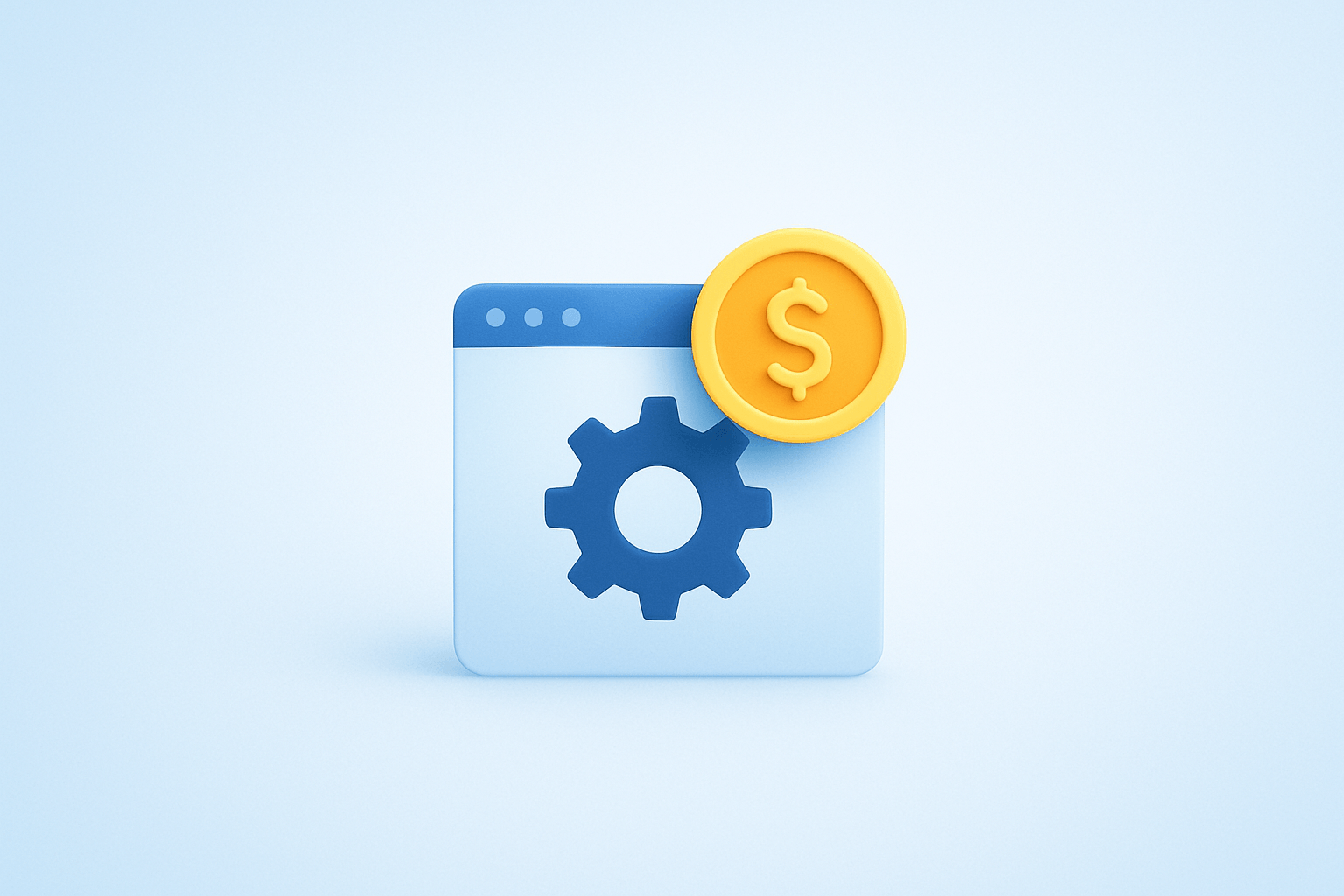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 사업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예산과 인력 등의 한계로 어렵던 디지털 사업을 민간 자본과 기술로 추진하는 형태입니다. 주요 법령인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정을 받고 운영되는데, 투자자는 프로젝트를 맡아 개발과 운영을 하지만 공공의 통제 아래 있으며 서비스 권한은 여전히 공공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민영화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TOPIK 디지털 전환과 미래 비전 국회토론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찬반 논쟁과 함께 공공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발제자와 패널 토론자들은 사업을 민영화로 오해하거나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실제 계약 세부내용, 추진계획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백승주 전남대 교수는 계약 내용 전면 공개가 어렵더라도 공공성 저하 가능성이 있는 핵심 사항은 공개돼야 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기록과 평가를 담은 백서 발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두 차례 비공개 간담회만 열렸고, 정작 사업 관련자들이 대외적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설명을 진행하지 않아 불신이 쌓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국립국제교육원과 교육부는 민간 플랫폼 의존 우려에 대해 일부 해명했으나 구체적 해명이나 적극적 공개에는 미흡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공공성과 투명성은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할 때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의견수렴 절차 미비는 향후 법적 분쟁 소지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번 사업 추진 시 한국어 이주민 등 직접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공개된 공청회 개최 등 숙의 과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민간투자형 사업의 정체성과 공공성 경계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홍보 및 설명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구체적 계약 조건과 운영 방안을 일정부분 공개하는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은 공공사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법적 투명성과 사업 주체간 신뢰 확보 없이는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례가 보여주는 셈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비슷한 민간투자형 사업 추진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실질적 교훈으로 기능할 것입니다.